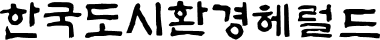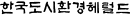지난 칼럼에서 수포자 관련한 글을 실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포자를 넘어서는 수학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자 한다. 자, 어떤 문제를 ‘안다’고 하는 것을 수학공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학습관 아이들에게 수능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시키고 있다. TOS(Target Oriented Study) 관점에서의 공부법이다. 목표점을 정확히 알고 공부하자는 것이다. 최근 5개년의 수능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수능문제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수능에서의 고득점이 목표라면, 평소 이 패턴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부법이 될 것이다.
수능 문제를 보면, 처음에는 2점짜리 문제로 워밍업을 시킨다. 4번부터 3점짜리 문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10번 즈음에서 4점짜리 문제를 만나게 되다가, 15번 즈음해서 드디어 고난이도 문제가 연속적으로 3~4문제 나타난다. 바로 이 부분이 고비다.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25번 근방에 나타나는 2차 고난이도 문제도 무난히 풀 수 있다. 보통 변별력을 위한 5점짜리 같은 4점짜리가 바로 15번 부근, 25번 부근에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황하게 되면 수능시험을 망치기 쉽상이다.
15번 즈음해서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지수로그 함수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2010년과 2011년 수능이 그런 경우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서 좌절감을 맛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보통은 보기 3개를 주고 이것에 대해 옳은 것을 찾아 내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 대부분은 아마도 이리 저리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어 낼 것이다.
물론, 수능 시험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니 끼워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관련 개념을 100%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어야 실전에서 끼워 맞추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요령만 익히는 연습을 하다가는 실전에서 매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행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별을 고하곤 하기 때문이다.
2010년 수능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이다. 수능 16번 문제를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그럼, 나와서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라.”라고 주문했다. 의기양양하게 나온 이 아이는 1분 정도 설명을 해 나가다가는 곧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분명히 풀 수는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답은 맞췄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된다. 아는 건가? 이리 저리 끼워 맞춰서 답을 맞추기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는 것이다. 급기야 이 아이는 억지를 쓰고 만다. “맞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 보았다. “너희들은 쟤의 설명을 이해 하겠니?” “아뇨!”
물론, 내가 꽤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정의하는 ‘안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나보다 이해의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아는 것이다. 이것은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100%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에서의 수학 1등급을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많은 문제를 풀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공부법으로는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혼자서만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결코 수능 1등급을 받기 어렵다. 논리 없이 요행을 바라다가는 어김없이 수능을 망치고 말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어떤 문제를 ‘안다’는 것은 ‘답이 맞았다’가 아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되, 문제에 적용된 기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답을 도출해 내는 과정까지 논리적으로 막힘 없이, 나보다 이해의 수준이 낮은 다른 사람을 완벽히 이해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답이 맞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그렇게 공부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에 치중하지도 말자. 철저하게 질을 높이는 공부를 하자.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다.
수능에서는 보통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14문제, 4점짜리 13문제가 출제된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 온 아이는 2점짜리는 30초, 3점짜리는 2분내로 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4점짜리 문제이다. 4점짜리 문제의 총 배점은 52점이다. 승부는 여기서 갈린다. SKY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변별력을 위해 출제된 5점짜리 같은 4점 2~3문제, 15번과 25번 부근의 문제들이 바로 인생을 가르는 문제들이다.
다소 수학적인 분석을 해 보자. 2점, 3점짜리는 보통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90% 정도만 이해해도 대부분 풀 수 있다. 그러나 4점짜리 문제는 보통 몇 가지의 개념을 조합해서 문제를 낸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개념들을 100%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
여기 3가지의 개념을 조합해서 낸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평소에 어떤 개념을 100%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90% 정도로 공부해 왔다고 하자. 이런 경우, 90%*90%*90%=73%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낮은 60% 이하가 될 가능성도 크다. 자, 어떻게 될까? 계산상으로는 4점짜리 13문제 중에서 5문제~6문제는 틀린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2009년 수능처럼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 된다면, 아마 4점짜리 중 절반도 풀 수 없을 것이다. 60점에 턱걸이 하는 것이다.
이제 공부를 확실히 하려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 하게도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당연히 공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독서를 할 때도 다독 보다는 정독을 한 후에 스스로 생각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공부를 할 때도 문제는 적당히 풀되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좋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 보는 것이 더 좋다.
무조건 머리 속에 집어 넣는 것을 공부라고 오해하게 되면 머리 속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뿐이다. 집안에 물건을 잔뜩 사 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다 두었는지 찾을 수도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다!
머리를 맑게 하자. 내가 푼 문제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자. 공부를 할 때는 100% 확실하게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자. 답을 맞췄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환경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자. 그러니, 어떤 문제를 물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고마워하자. 스터디그룹을 만들어도 좋다. 반드시 성적이 비슷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은 친구에게 개념설명부터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 주는 것은 나에게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까. 물론, 듣는 아이도 훌륭한 공부가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기주도학습은 적극적인 공부법이 되어야 한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완벽성을 내포한다. 100%를 추구한다. 스스로 공부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학원에서의 학생의 역할은 관객이었다. 이제 주인공이 되어 보자. 가끔은 내가 명강사가 되어 보자. 수학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글/빈현우 PMC(Postech Math Consulting) 자기주도학습연구소(포스텍자기주도학습관) 소장 binhw@daum.net]
자기주도학습의 재해석…너 이 문제 알아?
- 입력 2011.04.04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시환경헤럴드
desk@kueherald.co.kr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