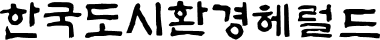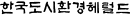“연극이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세상에 메시지는 남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동 창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재는 큰 사회 문제의 하나인 치매.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이고 치매의 75%는 알츠하이머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같이 고통받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즉,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돌봄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야기는 강제 위안부였던 할머니가 치매를 앓는다는 설정으로, 결국 인간의 존엄을 다루었습니다. 강제 위안부였던 할머니의 과거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 할머니와 아들이 모자의 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루는 법을 너무 어둡지 않게 너무 비극적이지 않게 웃음을 기반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채플린이 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을 기억하며.
[시높시스]
- 소녀는 공장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마을잔치에서 기념사진까지 찍고 다다른 곳은 공장이 아니라 군 강제위안소였다. 여기서 꽃다운 조선의 소녀는 일본군의 만행에 처절히 찢겨 ‘지옥도 이거보다는 나으리라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할 것’이란 생각을 가질 무렵 전쟁이 끝나고 사선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주위엔 온통 멸시와 천대 싸늘한 시선뿐... 그는 고향에 와서도 지옥을 본다.
하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해 미친 듯이 일을 해 돈을 모으는 여인 곁에 따듯한 인성의 청년이 다가와 사귀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으나 여인이 위안부 출신임을 알게 된 청년은 그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몰래 떠나 버린다.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른 여인은 노년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 꾸역꾸역 살아온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며 가족을, 사회를, 자신을 버리게 되는 병이었던 것... 어머니와 아들의 사투에 가까운 모진 삶의 상처..
이들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싶었던 과거. 평생 잊고 싶었던 상처를 가진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기억을 잃어가면서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잊혀지는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
이 극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은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간다. 비극 속에서도 살아야 할 실마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어디 한 곳 부족해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화두를 던져본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족(인류)의 해체를 겪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발 하라리의 얘기처럼 수렵 채집의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며 재산과 계급이 생겨나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격랑을 겪고 있다. 원치 않았던 불가항력적 힘 앞에 몰린 가족(인류)의 생채기에 치유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