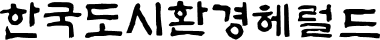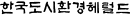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어두운 길을 지날 때 한번쯤 뒤를 돌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공포심은 대한민국 여성에게 낯선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들을 안심시켜줄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에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여성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성은 다급히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1초 차이로 문은 닫혔고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다. 1초만 늦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한 후 연락 달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범죄 상황에 노출된 여성을 안심하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스스로 증거물을 확보해 가져오라는 경찰의 대응은 경악스럽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벌금 단 8만원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스토킹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신고 건수는 279건, 올해 4월 신고 건수는 475건으로 5개월만에 약 200건이 증가했다. 하지만 스토킹의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 스토킹 처벌법은 2013년에 ‘지속적 괴롭힘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추가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스토킹은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경우 범칙금 8만원만 처분된다. 이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조차 주지 못하는 수준의 처벌이다. 범칙금 외에 스토커의 접근을 막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해야 한다. 접근금지신청서에는 스토커의 신원과 주소 등이 필요하고, 스토킹 증거를 일일이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법이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돈만 내면 자유로울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은 잠 못 이루고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다니, 불공평한 현실이다.
스토킹은 강간이나 살인의 전조행위로도 보여진다.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 380여건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의 30%(159건 중 48건) 가량에서 살인이 일어나기 전 스토킹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 경험자가 22.4%(57건) 이었고, 가정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 경험자는 7.1%(46건)에 달했다. 상담소 측은 “스토킹은 더 중한 범죄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스토킹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행위임을 기억해야한다. 현재의 스토킹 처벌 관련 조항은 처벌의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다. 반드시 피해자가 입는 아픔을 함께 고려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체감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스토킹 처벌법은 8건 발의되었다. 하지만 각 법안은 폐기되거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19대 국회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 발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토킹 처벌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역할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늘어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8월 22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면서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다 살해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피해자는 신고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신고 사실을 알자마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결국 가해자는 살인죄로 징역 30년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그의 딸들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았다.
이처럼 현행법은 예방이 아닌 사후처방의 형식을 띤다.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식이다. 스토킹은 직접 큰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애매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과 보호는 이뤄져야한다. 피해자가 주거 침입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후에야 처벌과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의 순서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후처방식인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과는 다르게 일본과 영국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분 결정 단계를 최소화했다. 일본은 검사나 법원의 개입 없이 현장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 또한 현장경찰이 가해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이외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 선진국가는 가해자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등 정확한 스토킹 처벌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강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스토킹을 예방하면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국회는 해외의 스토킹 처벌법을 참고해서라도 빠르게 의견을 조율해 법으로 제정해야한다. 더 이상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계류되어 피해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